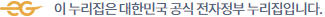재외동포 광장
문학작품 한 편씩 읽기
역대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작을 한편씩 선정하여 소개합니다.
[시] 밥을 지으며
- 작성일
- 2022.01.18
시-가작
밥을 지으며
이 현 순 [독일]
하얀 한국산 쌀을
하루쯤 물에 담가 두었다가
깨끗이 씻어서 밥을 지을 때면
모락모락 밥이 끓으면서 내는
하얀 김을 얼굴 전체로 맡는다.
온 집안에 밥 내음이 풍긴다
그 구수한 감칠맛이
축 처진 내 어깨를 올려주고
웅크린 가슴을 펴게 한다.
혈관 속으로 직접 스며드는 듯
고향 땅, 흙 맛 같기도 하고
어머니의 향기 같기도 하다.
50년이 넘은 타향살이에도
하루에 한 끼라도 밥을 먹지 못하면
심신이 고프고 허전하다.
쌀밥이 부잣집이나 제사상의 음식처럼
귀하던 1950-60년대
보릿고개의 고국이 생각나고
쌀을 구할 수 없어 푸석푸석한 흰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체격이 육중한 독일 환자들을
간호하기에 힘겨웠던 1970년대
그 가슴 시린 독일에서의 일상이 떠오르면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따뜻하고 찰기 있어 맛있는
하얀 쌀밥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지금
밥을 먹어서 고픔을 달래고 속이 편안하니
타향살이도 훨씬 수월하여
한시름 놓을 수 있지 않나?
가을날 알알이 익어가는 황금빛 벼 이삭을
시골길에서 바라보는 풍요로움은 또 얼마나
농부가 아니라도 흡족한가!
산골짜기 다랑이 논에서
밀짚모자 쓰시고 땀으로 얼룩진 얼굴로
모내기, 벼 타작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 새참 머리에 이고가실 때
막걸리 술 주전자 들고 촐랑촐랑
즐겁게 뒤따라가던 단발머리 소녀였던 나,
지금도 눈에 밟힌다.
아, 쌀밥, 나에게 보약 같은 음식!
“밥 먹었나?” 정다운 우리의 인사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면 나는 고맙고 행복하다.
언제 어디서나.
- 다음글
- [시] 한글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