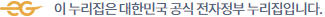재외동포 광장
문학작품 한 편씩 읽기
- 작성일
- 2022.12.12
일반산문 부문(수필) 가작
고사리
김 미 현 (미국)
“앗, 여기도 있다.”
“이건 잎이 펴서 안 되겠네.”
나뭇가지에 새잎이 돋기 시작하는 봄에 하이킹을 하다 보면 볕 좋은 양지에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고사리를 발견할 수 있다. 키 크고 튼실한 콩나물을 세워놓은 듯한 ‘그것’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고사리라는 것을 알게 된 건 워싱턴 주로 이사 온 지 6년이 넘은 작년의 일이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남편과 나는 고사리를 밥상에서나 봤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모습’은 그 때까지 본 적이 없었다. 간혹 한인마켓에서 사람들이 직접 말린 고사리를 파는 걸 보긴 했지만 한 봉지에 30~40달러나 하는 비싼 가격에 놀랐던 기억만 있었다. 그러다 고사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시애틀이 청정지역이라 고사리가 맛있다’는 댈러스에 사는 이모의 말씀과 엘에이에서 이웃에 살던 친구로부터 ‘시애틀 고사리 유명하다’는 말을 연거푸 듣게 되면서부터다.
‘흠, 시애틀 고사리가 맛있다고?’
연중 여름 2~3개월을 빼고 줄곧 비가 내리는 워싱턴 주는 사철 푸른 숲을 볼 수 있어 에버그린 스테이트(Evergreen State)로도 불린다. 비가 많이 내린다니 한국의 장마철을 떠올리겠지만 대개는 퍼붓는 비가 아니고 부슬부슬 꾸준히 내리는 비다. 그것도 하루 종일 내리는 게 아니고, 아침에 비가 오다가도 낮에는 볕이 화창하고 그러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흐리는 등, 구름의 이동에 따라 비가 오고 가기 때문에 비가 와도 그다지 축축하단 느낌이 없다. 구름을 몰아내는 바람이 빗물도 금세 말려서 쾌적하고 상쾌한 날씨다. 그러다보니 나무와 풀이 잘 자라 숲이 울창하고, 공기가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이 되는 것이리라. 겨울에나 잠깐 비를 구경할 수 있는 엘에이에서 17년을 살다 이사 왔을 때는 이곳의 푸른 숲과 맑은 공기가 너무 반가웠다. 마치 우리나라 강원도 어느 산골 같은 풍경에 홀려 주말이면 지역 곳곳에 있는 산을 찾아다녔는데, 그 산에 먹을거리가 있을 거란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 이 지역 고사리의 유명세를 듣게 된 것이다.
그 뒤부터 산에 오를 때마다 ‘고사리가 이 산에도 있지 않을까?’ 주변을 주의 깊게 둘러보게 됐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고사리가 눈에 들어왔다. 재미로 한두 개 꺾다 보니 내려올 때는 양이 꽤 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 반찬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찾아봤다. 바로 딴 고사리에는 독소가 있으니 끓는 물에 삶아 한나절 동안 물에 담가 독소를 빼주는 게 핵심이었다. 그렇게 한나절 동안 수시로 물을 갈아주며 담갔다가 꼭 짜서 간장, 소금, 파, 마늘 등을 넣고 조물조물 무친 뒤 간이 배도록 볶았다. 산에서 캐와서 음식을 해 먹는다는 건 TV에서나 봤지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남편과 나는 고사리 나물에 쉽사리 젓가락을 댈 수 없었다.
“이걸 먹어도 되는 거야?”
“글쎄? 먹고 죽는 건 아니겠지?”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을 먹어보니 어릴 때 먹었던 그 맛인데 제철에 딴 생고사리라 그런지 연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었다. 역시 사람들 말이 맞았다. 왠지 보물을 발견한 느낌이었다. 다음 하이킹 때 고사리를 또 따려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철이 지났는지 잎이 활짝 핀 고사리만 볼 수 있었다.
이번 봄이 되자 작년의 고사리에 대한 기억이 다시금 떠올라 기대를 안고 산에 갈 날을 기다렸다. 고사리 철은 3월에서 5월까지라고 하는데 비가 안 오는 주말을 택하다 보니 4월에서야 하이킹을 가게 되었다. 고사리는 큰 나무 밑 그늘진 곳에 많이 있지 않을까 둘러봤지만 예상과 달리 약간 높은 지대의 양지바른 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밝은 햇살이 비치는 곳에 키가 1미터도 넘는 고사리들이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이란…. 굳이 숲을 헤치고 들어가 찾지 않아도 길가의 손닿는 곳에 있는 것만 ‘똑똑’ 꺾어도 짊어지고 간 작은 배낭 하나를 금세 채울 수 있었다. 고사리가 작년부터 자란 것이 아니고, 하이킹도 작년에 시작한 것이 아닌데 이제야 눈에 보이는 걸 보니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진리였다.
하지만 고사리가 주인 없는 것이라고 무한정 딸 수 있는 건 아니다. 삼림 소유주가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카운티정부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판매용이 아닌 경우 5~15갤런까지 딸 수 있다고 한다. 작은 배낭에 가득 따온 고사리를 집에 오자마자 삶았더니 하루 종일 고사리 냄새가 집안에 진동했다. 작년엔 적은 양이라 미처 몰랐는데 고사리는 삶을 때 특유의 냄새가 지독하고 그 냄새가 집안에서 잘 빠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두 번째부터는 뒷마당에 버너를 켜고 커다란 냄비에 삶았다. 이렇게 삶은 고사리 일부는 양념해서 볶아 나물로 먹고, 일부는 소고기 양지를 삶은 국물에 숙주, 파와 함께 넣고 푹 끓여 육개장을 해먹었다. 또 일부는 오일 파스타를 만들 때 마늘과 고사리를 함께 볶은 뒤, 면을 넣고 볶았더니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잘 어우러져 일품이었다.
다양한 요리를 해먹고 남은 것들은 뒷마당 테이블 위에 펴서 널어두었다. 마침 날이 맑아 하루 이틀 만에 바짝 말랐다. 고사리를 따서 삶고 말리는 과정을 직접 해보니 마켓에서 1파운드에 30~40달러에 파는 가격이 비싼 게 아님을 알게 되었다. 말린 고사리 1파운드를 만들려면 그 대여섯 배나 많은 생고사리를 삶아서 말려야 하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나는 처음해본 것이라 그런지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니 그 모든 과정이 그저 즐거운 놀이처럼 느껴졌다. 이런 재미에 두어 차례 더 고사리를 따서 삶고 말려 반찬통에 담고 보니 양이 꽤 되었다. 이 중 일부를 댈러스에 계신 이모께 보내드리기로 했다.
이모는 구순이 목전이고, 이모부는 구순을 넘긴지 몇 해 되었다. 이민해 온 지 60년이 넘는 긴 세월에 한국어보다 영어가 익숙한 분들이지만 입맛은 변치 않아 이모부는 지금도 하루 한 끼는 꼭 한식을 드신다. 두 분 모두 의사로 한평생을 일하다 은퇴한 뒤 3, 4년 전까지만 해도 1, 2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했지만 이젠 노쇠해서 한국방문은 엄두도 못 내셨다. 그게 안타까워 두 해 전 한국산 전기 압력밥솥을 보내드렸더니 ‘예전엔 일제밥솥이 최고였는데 한국밥솥이 어쩜 그렇게 밥맛이 좋냐’고 두고두고 고맙다는 인사를 해오셨다. 직접 따서 말린 이 고사리를 보내드리면 나물을 특히 좋아하는 이모는 아마 탄성을 지를 것이다. 소박한 나물 한 그릇이지만 고국을 그리워하는 두 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다면 좋겠다.
엘에이에 사는 친구 것도 챙겨야겠다. 엘에이는 한국 식재료를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곳이긴 해도 제철에 딴 햇고사리를 구경하기는 쉽지 않다. 직장 생활에 바쁘고, 재미있게 사는 삶이 제일 관심사였던 친구는 이제 나이가 들어 병든 부모 곁을 지키며 두 분의 밥상을 챙기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는 터이니 이 고사리가 더욱 반가울 것이다. 그의 부모님께 작게나마 위안이 되는 반찬이 되기를 바래본다
.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포장하다보니 ‘고사리가 뭐라고 이렇게 큰 바람을 담나’ 싶어 피식 웃음이 났다. 한낱 말린 풀에 불과한 고사리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줄은 한국에 살 땐 미처 몰랐다. 그런 게 어디 고사리뿐이랴. 어릴 때 고향에서 먹던 음식 하나하나를 여기서 발견할 때마다 그 시절 풍경과 그 안에서 숨 쉬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진 경험은 고국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음식을 접하기 힘든 외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까지 갈 시간이 없으면 뉴욕이나 엘에이같이 한인타운이 크게 형성된 도시로 ‘먹방 여행(?)’을 하면서 대리만족이라도 하는 것이리라.
청춘의 한 시절을 보낸 엘에이에서는 직장에 다니고 아이를 키우느라 향수를 느낄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중년에 접어들어 나를 온전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수구초심’의 마음이 깊어짐을 느끼게 됐다. 고국에서 산 날보다 훨씬 많은 날을 미국에서 산 노인일수록 더 그렇겠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산 날에 비례해 커지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그리움은 자라나는데 거동은 점점 어려워지니 안타깝기만 하다.
고사리가 그 안타까움을 달래줄 수 있다면 내년에도 산에 올라 기꺼이 따서 말려 주변과 나누고 싶다. 워싱턴 주에 사는 동안은 고사리 따기가 우리 부부의 연례행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다.
- 이전글
- [수필] 노크
- 다음글
- [체험수기] 제니를 찾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