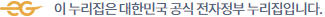재외동포 광장
문학작품 한 편씩 읽기
- 작성일
- 2022.12.13
일반산문 부문(수필) 우수상
소음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채 단 비 (프랑스)
드디어 빨래 바구니가 다 찼다. 가득 찬 빨래 바구니를 보는 나는 미소가 번진다. 이케아 빅사이즈 빨래 바구니를 왼쪽 어깨에 둘러 멘다. 짐은 최소로 할 것. H&M 빛바랜 청재킷 안주머니에 동전 지갑, 열쇠, 휴대폰, 책 한 권을 욱여넣는다. 집 밖을 나설 때면 언제나 내 곁을 지키던 흑기사, 회색 백팩과 유선 이어폰을 두고 가려니 막상 아쉽다.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괜히 질척거린다. 그래도 먼 길 떠나는 거 아니니 괜찮다고, 이내 자신을 다독이며 손을 거둔다.
걸어서 5분. 손잡이를 돌리지 않아도 열리는 문 앞에 선다. 내가 원할 때 언제나 발을 들일 수 있는 곳. 하얀 타일, 하얀 벽. 코끝을 스치는 알코올 소독약 냄새. 바로 직전에 청소를 끝낸 모양이다. 유리 통창을 뚫을 듯 햇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햇살과 나만 공간을 채우고 있다. 아무도 없다. 오길 잘했다. 들고 온 이케아 백을 모두 비우고 창 너머 인도와 2차선 도로를 잠시 바라본다.
한국과의 거리 약 9,400km, 시차 7시간(서머 타임 적용 시). 올해로 프랑스에 산 지도 햇수로 11년이 되었다. 프랑스에 살며 4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얻지 못한 단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세탁기이다. 유학 초기 나의 첫 세탁방은 기숙사 근처 작고 그늘진 건물 1층의 허름한 공간이었다. 처음 그곳에 발을 들였을 때 세탁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힐끗거리며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 세탁기에 빨랫감을 넣을 때도 세탁 세제를 부을 때도 시선이 날아와 내 몸 여기저기에 꽂히는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은 세탁방에서 술을 마시며 쉬는 노숙자를 마주치기도 했다. 괜히 덤덤한 척 빨래를 준비했지만 두려움에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날부터 한동안 집에서 손빨래를 했다. 세면대에서 청바지를 빨고 손으로 짰다. 집 안 곳곳에는 널어놓은 양말과 속옷들로 빨래 커튼이 생겼을 정도였다. 이때부터였을까. 내게 세탁은 세상에서 가장 귀찮은 골칫거리가 되었다.
손빨래 생활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신식 기숙사 옥탑방으로 이사를 했다. 지긋지긋했던 룸쉐어를 청산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숙사 지하에 코인 세탁기가 있다는 사실에 이미 내 마음은 들떠 있었다. 옥탑방이면 어때, 이렇게 삶의 질이 한층 올라갔는데!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건물 지하는 생각보다 무서운 곳이었다. 세탁방은 항상 어두웠다. 불을 켜도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져서 다시 어둠 속에 갇혔다. 내 뒤에서 아니면 컴컴한 구석 어딘가에서 누가 튀어나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세탁기를 돌리자마자 항상 도망치듯 내 방으로 달아났다. 손빨래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이제는 세탁이 어떻게든 미뤄야 할 공포의 미션이 되어버렸다.
기숙사 생활을 전전하다 프랑스인 남편을 만나 2017년부터 함께 사는 지금도 여전히 코인 세탁방을 다니고 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사다리꼴 모양의 우리 집. 손바닥만 한 크기의 화장실 겸 욕실, 주방, 거실, 침실이 경계 없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문과 출신답게 2,000여 권의 책을 짊어지고 사느라 집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이 9평 짜리 집에 남편이 먼저 이사를 들어왔을 때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밥이냐 세탁이냐. 주방 싱크대 옆에 가스레인지와 세탁기를 둘 유일한 자리가 있었던 것이다. 당신의 선택은? 남편은 주저없이 가스레인지를 선택했다. 선택의 대가로 우리는 배부름을 얻었지만 빨랫감과 세탁 세제를 챙겨 매주 집을 나서야 하는 귀찮음을 감수해야 했다. 처음에는 남편의 선택을 납득할 수 없었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 출신이면 뭐하나, 요리에 취미 하나 없는 양반이면서…. 이런 사람이 가스레인지와 오븐을 고집하다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후발대로 집에 들어온 굴러온 돌이니 별다른 발언권이 없지 않은가.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나는 세탁기를 언제 장만할 수 있을까….’ 한동안 무거운 빨래 가방을 들고 고군분투할 때면 내딛는 발걸음마다 구시렁대며 불평을 쏟아냈었다.
어느덧 프랑스 살이 8년 차가 되었고, 코로나19라는 폭탄이 떨어졌다. 곧이어 프랑스 전국에 봉쇄령이 내려졌다. 하늘길도 막혀서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갈 수도 없었다. 한국 역사책에서나 배웠던 이동 제한령과 통금을 프랑스에서 겪었다. 마트, 코인 세탁방, 약국처럼 기초 생활 영위를 위한 곳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할 수 없었다. 삽시간에 9평 투룸이 나의 온 세상이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9평짜리 사람이 되어갔다. 학업과 살림, 여가생활까지 9평 안에서 해결해야 했다. 내 몸이 닿고 생각이 머무는 곳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시간도 공간도 멈췄다, 9평 안에서. 가장 편안했고 언제나 안락할 거라고 믿었던 집이 답답해졌다. 극 내향형인 내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성전이었던 집이 나를 옭아매고 위협하자 내 안에서도 연이어 폭발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와 거의 동시에 나는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박사 1년차의 패기로 도서관에서 닥치는 대로 책을 빌려왔고 비상금을 털어 책을 사들였다. 하지만 도서관도 카페도 문을 닫은 코로나 시국에 수십 권의 책을 읽고 공부할 곳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집에서 책장을 아무리 넘겨봐도 진도가 나가지 않았고 무기력과 자괴감만이 나를 감쌌다. 프랑스어로 학업을 해야 하는데 프랑스어가 읽히지 않는 지경까지 다다른 것이다. 대책이 필요했다. 석사 시절 세탁방에 노트북을 들고 가 한두 번 논문을 썼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 당시 영감을 얻기 위해 엉덩이를 붙인 곳마다 노트북을 열고 타자를 두드렸었다. 휴가에서 돌아오던 차 안에서도, 수업을 기다리던 학교 복도에서도, 그리도 세탁방에서도. 그 어떤 음악보다도 내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 탁월했던 세탁기 소리. 그 소리가 귀에서 맴돌았고 그 길로 자처해서 빨랫감을 들고 밖에 나갔다. 책 한 권을 품에 안은 채.
홀로 세탁기 앞에 앉아 세탁기 소리에 몸을 맡긴 채 책을 읽기 시작했다. 집에서 3시간 동안 붙잡고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던 단어와 문장이 30분 안에 해결되었다. 귀찮음과 짜증을 이케아 백에 넣어 갔던 세탁방이 오히려 나의 안식처가 되었다. 마음 편히 자발적으로 산뜻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찾던 내게 세탁방은 최적의 공간이었다. 마음이 맞는 프랑스인 남편과 살아도, 지나가다 얼굴을 보고 인사를 건네는 이웃들이 있어도 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생긴다. 아마도 더 오래 마음을 나누고 웃음을 나눴던 한국 가족들을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해 피어난 아릿한 감정 때문이겠지. ‘아, 나는 집을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9평 집보다 더 작은 코인 세탁방에서 한국 집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졌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가 아니라 ‘이 소음’을 찾아 집을 나섰다. 깨끗한 빨래보다 소음을 들으러 구시렁대지 않으며 발길을 재촉한다. 소음을 들으며 나만의 시공간에 스스로 갇히러 집을 나섰다. 마지막 동전을 기계에 넣고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소음 안으로 몸과 마음을 서서히 밀어 넣는다. 일정한 기계음. 물소리.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덜컥 멈추다가 다시 흐르는 물소리. 클라이맥스는 탈수 시간. 절정에 다다르다가 템포를 늦춘다. 결말을 향해 서서히 작아지는 기분 좋은 소음. 9평 집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던 향수와 답답함이 소음을 따라 조금씩 사라진다.
적막. 세탁기도 나도 미션 종료. 세탁방의 네모난 문으로 나가기 전 세탁기의 둥근 문을 연다. 바짝 젖어 서로 뒤엉킨 물기 먹은 티셔츠와 바지, 옷가지보다 많은 여러 켤레의 양말을 이케아 백에 차곡차곡 담은 후 왼쪽 어깨에 둘러멘다. 건조는 집에서 할 수 있다. 30분 전 밟았던 길을 되돌아간다. 이제 다시 9평 집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결국 나는 박사 논문을 끝내지 못했다. 코로나와 함께 박사 3년을 보내고 집, 도서관, 세탁방을 번갈아 가며 내 연구의 의의와 동기를 찾아보려 발버둥쳤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도 세탁방에서 다시 책을 읽는 즐거움을 되찾았다는 것에 만족한다. 내 마음의 향수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세탁 30분으로 해갈될 향수가 아니었음을 또 한 번 깨달았다. 하지만 9,000km를 비행기로 날아가야 도착할 수 있는 집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는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3년 반의 시간을 버티러 세탁방에 간다. 빨래 바구니가 어서 빨리 찼으면 좋겠다. 오후 2시의 햇살을 받으며 세탁방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니 말이다. 청재킷 안주머니 속 가죽 지갑에서 동전이 짤랑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