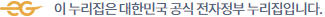재외동포 광장
문학작품 한 편씩 읽기
- 작성일
- 2024.01.24
청소년 글짓기 중・고등 부문 장려상
언니! 날 안아줘서 고마워!
윤예서(독일)
나는 독일에서 7년째 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언니, 오빠, 형, 누나와 같이 나이를 기준으로 서열을 매기지 않고 거의 모든 경우 상대방을 ‘친구’라고 부르거나 직접 이름을 부른다. 같은 학급 내에서도 서로 나이가 다른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친구로 지낸다. 나는 독일에 와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던 때부터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다. 나보다 서너 살 어린아이들이 친구가 되자며 내게 말을 건 것이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친구로 지내는 문화가 신기하면서도 조금 낯설긴 했다. 하지만 언니라서 다가가기 어려워하거나 동생이라 너무 어리게 보지 않는 시선들이 신선하고 좋기도 했다. 나이와 상관없이 동등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알아 가고 관계를 지속하는 문화는, 적어도 한국인으로 살아오며 예절을 배워 왔던 나에게는, 겉모습보다는 실리를 중시하고 관계에 집중하는 것으로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한국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먼저 물어보거나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몇 살이세요? 몇 년생이세요?”이다. 만약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다면 나보다 아는 것과 경험한 것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더 챙겨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런데 상대가 나와 동갑이라면 ‘한배를 탄’ 사람이라는 동료애의 감정이 느껴진다. 결국 한국인들에게 ‘나이’는 서로의 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독일과는 매우 큰 차이를 느낀다.
개인적으로 나는 장녀로 컸는데 어릴 때부터 내가 “언니”라 많은 경우에 동생보다는 순서가 먼저였지만 한편으로는 더 많은 책임감도 요구받았다. 한국과 독일의 문화를 둘다 경험해 본 내 입장에서 어느 하나가 좋거나 나쁘다고 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실리에 집중하되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는 다소 어려운 독일 문화와, 서열로 관계가 시작되나 정으로 요약되는 우리의 정서는 비교하거나 우열을 가릴 수 없기때문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한국 사람의 정서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다. 때로는 나에게 그런 한국의 DNA가 있다는 것에 자부심과 뿌듯함이 느껴지기까지 한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름을 부르기보다 “언니, 오빠”라고 부를 때 느껴지는 편안함과 친근함, 그리고 유대감에 나는 내가 독일에 사는 ‘한국인’임을 자각하게 된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나이 차이에 달라지는 호칭으로 구분되는 관계를 통해 서로의 마음이 열리면서 더 친밀하게 만 들어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의 의미 와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는 “언니”라는 단어가 좋다. 이 정겨운 단어는 내 마음 한구석을 뭉클하게 해주며 내게 너무 많은 ‘정’ 을 느끼게 해준다. 내가 만났던 대부분의 언니들은 나를 처음 본 순간부터 경계심 없이 정을 퍼 주었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 아주 예민했던 중학생 시기에 인간관계 문제와 외국 땅에서 한국인으로서 겪는 외로움 등으로 많이 지쳐 있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에는 모든 게 다 버겁고 힘들었었다.
마침 그때 어떤 경로로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된 언니들은 이미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나와 함께 놀아 주며 나를 대해 주었다. 어느 날은 밤을 새우며 첫사랑부터 흑역사까지 모두 이야기해 주며 밤새 깔깔거렸다. 그 언니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너무 힘들고 외로웠던 나에게는 그 언니들이 내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다.
많은 사람의 인생이 그렇든 지금까지의 내 삶도 항상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고 종종 난관에 부딪혔다. 하지만 여러 ‘언니’들로부터 공감과 위로를 받았고 때로는 혼자서라면 찾아낼 수 없었던 조언을 받기도 했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결국 이리저리 치였던 나로서는 한 언니가 해준 “가끔은 좀 이기적이어도 괜찮아”라는 말이 그냥 문득 생각나 울컥했던 적도 있다. 그렇게 나를 감싸주거나 그냥 나를 와락 안아 주기도 해주는 ‘언니’들을 통해 갈 길을 잃 었던 나는 다시 일어나 씩씩하게 걸어갈 힘을 얻곤 했다. 또 언니들과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나가며 내 마음은 상처와 아픔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채워졌다.
그래서 나는 감동과 사랑과 행복이 공존하는 단어인 “언니”가 한국어에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좋다. 특히 내게 소중 하고 중요하고 나를 아껴주고 지지하며 응원해 주는 사람을 향해 “언니”라고 부를 수 있을 때 나는 그 “언니”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인으로서 감사함과 뿌듯함을 느낀다. 나의 독일 친구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내게는 그토록 소중한 사람이 그 한 단어로 설명이 된다.
물론 나도 가끔은 언니 역할이 부담스럽고, 동생들을 챙겨야 하는 일을 귀찮아하기도 하지만 내가 동생의 자리에 있을 때 나의 어떤 모습이든 좋아해 주고 더 예쁜 사람으로 다듬어 주던 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반성하고 후회 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한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계속 나아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따뜻하고 진정한 마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면 도리어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큰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주변에도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싸워 나가며 누군가의 위로나 응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넌 참 멋진 사람이야”라고 말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어린 동생들이 언니의 관심을 고파하며 나에게 “언니, 언니”라고 부르며 졸졸 따라오면 더 넓고 큰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안아 주는 사람도 되고 싶다.
마지막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독일에서도 나에게 언니라는 타이틀이 없어도 누군가가 나에게 해 주었던 언니 역할을 독일 동생들에게 해 주고 싶다. 내가 한없이 받은 사랑과 지지를 그들에게도 나눠 주고 싶다. 그리하여 그 아이들에게 한국인의 정을 느끼게 해 주고 싶고, 한국인의 정서가 얼마나 강력하고 대단한 것인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고 싶다. 푸른 눈을 가진 그들이 따뜻한 한국 ‘언니’의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말이다.